First Man
@firstman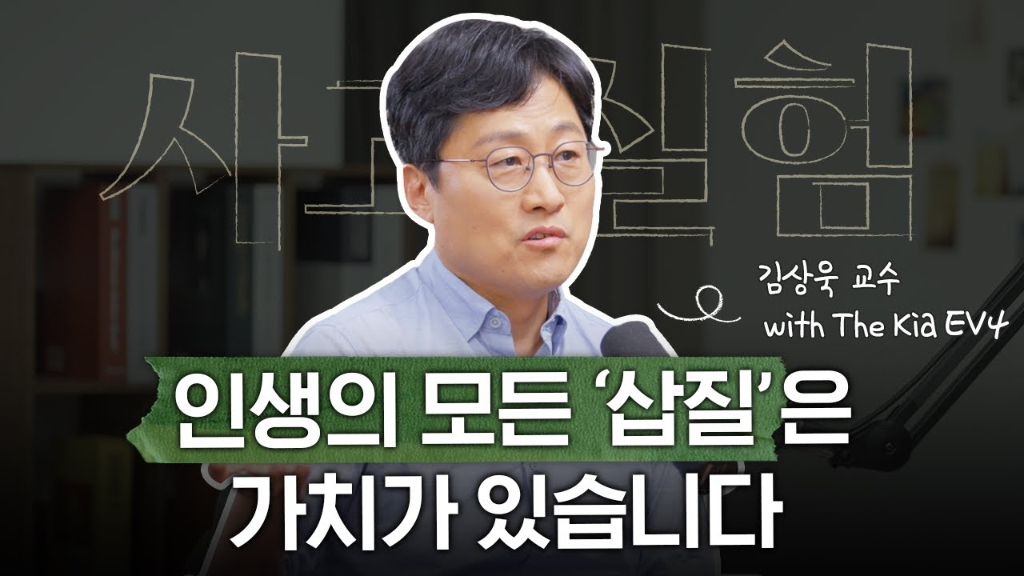
겉보기엔 '시간 낭비'라도, 결국은 꼭 거쳐야 할 일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충우돌하는 시간들이 있잖아? 그때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이건 완전 시간 낭비 아냐?' 싶을 때가 많을 거야. 사랑하다가 실연당하고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인생에서 꼭 겪어야 할 일들인 것처럼 말이야.
학문의 길도 마찬가지야.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예로 들어 설명해. 아인슈타인도 어느 날 갑자기 위대한 발견을 한 게 아니래. 전자 계약을 미친 듯이 공부하고, 뉴턴 역학과 모순이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전자 계약을 고치려고 엄청난 시간을 쏟아부었대. 고치고 고치고 또 고치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혹시 뉴턴이 틀린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새로운 것을 찾아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아. 수많은 시행착오와 막대한 시간, 엄청난 양의 '노가다'가 필요해. 근데 이 노가다를 기쁘게 해야 한대. 그게 재밌어서 해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답을 찾기 위한 외로운 여정: '여기에는 답이 없어'
세상에는 이미 밝고 편안한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진짜 답은 어두운 곳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새로운 곳, 고통스러운 곳에 말이지. 처음부터 섣불리 그곳으로 가면 위험할 수 있으니, 익숙한 곳에서 뭔가 시도하다가도 안 된다는 걸 경험해야만 용기를 내어 나갈 수 있어.
많은 개척자들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한 것도, 단순히 궁금해서가 아니라 원래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야. 김상욱 교수도 본인이 그랬대. 물리학과에 가서 양자역학을 배우는데, 교과서적인 방식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갈증을 해소할 수 없었대.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는 것만으로는 '왜 이런 것을 도입했나'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없었지. 그래서 친구들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양자역학이 태동하던 시기에 쓰여진 원서들을 찾아 읽으며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섰어.
이처럼 어떤 문제에 대해 '이 안에는 답이 없어'라고 확신하고 나갈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몇 군데만 둘러보고 '다음에 찾지 뭐' 하는 사람들은 절대 발견할 수 없지. 왜냐하면 중요한 문제의 답은 애초에 그 안에 없기 때문이야. 돌아가지 않을 명확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만이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연구의 길: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남기는 보람
김상욱 교수는 지난 30년간 단 하나의 질문, 바로 '양자역학과 고전역학의 경계는 어디인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연구해왔어. 우주를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 즉 거시 세계의 뉴턴 역학과 미시 세계의 양자역학 사이의 경계가 궁금했던 거야. 이 질문은 사실 양자역학이 탄생했을 때부터 수많은 물리학자들이 매달려온 아주 오래된 문제라고 해.
그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혼자 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대신 자신이 할 일은 작은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해. 마치 기후 위기가 정말 오는지 알기 위해 전 세계 곳곳에서 오랫동안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처럼, 자신은 경계 문제라는 거대한 질문에 필요한 수많은 데이터 중 하나를 얻는 일을 하는 거래.
이 데이터 하나를 얻는 것도 결코 쉽지 않아. 북극에서 빙하를 뚫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는 것처럼, 100번 실패하고 한 번 성공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해. 평생을 바쳐도 특정 지점의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남기고 죽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데이터 하나를 얻는 것이 바로 연구의 즐거움이라고 말해. 수천 명의 물리학자들이 수백 년간 연구해온 이 거대한 문제에 자신도 데이터 포인트 하나를 보태는 거야.
이처럼 겉보기에 '시간 낭비'처럼 보이는 좌충우돌과 헤매는 과정, 그리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탐구의 시간들이 모여 결국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김상욱 교수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